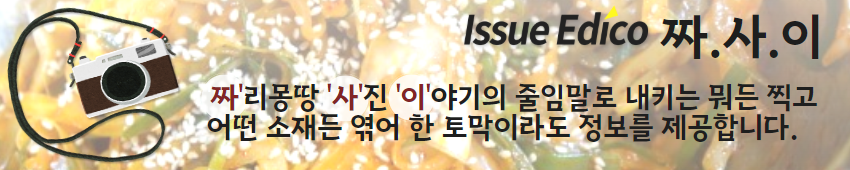
지지난밤,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소복이 내려앉은 눈이 아침 햇살을 만나 새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제설작업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일터에서 한숨 돌리며 도심 설경을 살피니 흰색이 주는 순수함이 마음을 들뜨게 하더군요.
눈의 결정들로 뭉친 백색 융단이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고스란히 끌어안고는 수많은 프리즘처럼 사방으로 퍼집니다. 이 찬란한 반사가 만드는 백색의 경이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경고를 품고 있죠. 아래 이미지는 집 주변의 풍경인데 제가 본 눈부심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 너무 아쉽네요.

지표면의 눈이 반사하는 강렬한 빛은 때때로 단순한 눈부심을 넘어 우리 눈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데, 이것이 바로 '설맹증(雪盲症, Snow Blindness)'입니다.
의학적으로 광각막염(Photokeratitis)이라고 부르는 설맹증은 눈이 강한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돼 각막 표면에 일시적 화상이나 손상이 생겨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눈(雪)이 많이 쌓인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설맹증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설맹증의 핵심 원인은 극도로 높은 자외선 반사율입니다. 새로 쌓인 눈은 태양광 속 자외선의 약 80~90% 정도를 반사하는데, 이는 일반 지표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스키장이나 고산 지대에서는 직접 쬐는 태양광과 눈에 반사돼 올라오는 자외선까지 눈에 이중으로 노출되죠.
이렇게 강력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막의 상피세포(표면 세포)에 상처가 생겨 염증이 발생합니다. 눈에 발생하는 화상이라고 여기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 질환은 자외선 노출 직후가 아니라 6~12시간가량 지난 후 발현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눈의 이물감, 뻑뻑함, 시야의 일시적 흐릿함 이후 극심한 안통, 강한 눈부심(광선 공포)과 함께 눈물 과다 분비, 두통 등이 동반되며 중증일 경우 일시적 시력 저하나 시야가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다만 대부분 일시적인 질환으로, 각막의 회복력이 빨라 비교적 단시간 내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네요. 설맹증이 나타나면 즉시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빛을 완전히 차단한 어두운 곳에서 눈을 감고 쉬어야 합니다. 눈 주변에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과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죠.
설맹증을 예방하려면 스키장, 눈 덮인 산 등 자외선 반사율이 높은 곳에서 활동 시 꼭 자외선 차단율 100%인 고글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이처럼 고글이나 선글라스로 간단히 예방할 수 있지만, 1세기 전 선조들에게 설맹증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가혹한 환경에서 설맹증과 사투를 벌였던 남극 탐험의 비극적인 영웅 로버트 팰컨 스콧(Robert Falcon Scott, 1868~1912)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목숨과 바꾼 연구…최초 목표는 두 번째였을 뿐
영국의 해군 대령이자 탐험가 로버트 스콧은 20세기 초 남극점 정복 경쟁에서 노르웨이의 로알 엥겔브렉트 그라브닝 아문센(Roald Engelbregt Gravning Amundsen, 1872~1928)과 맞섰습니다.
스콧의 두 번째 남극 탐험인 테라 노바(Terra Nova) 원정은 전 대원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 결말로 세계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탐험 기록 중 하나가 됐죠. 스콧을 포함한 5인 탐험대의 최우선 순위는 남극 대륙의 지질, 기상, 생물학 등 광범위한 과학 연구였으며 남극점 최초 도달은 두 번째 목표였다고 합니다.
경쟁자보다 보급 기지를 남극점에 110km 더 가깝게 설치하는 등 철저한 사전 계획을 세웠던 아문센이 1911년 12월 14일, 인류 최초로 목적지에 도달한지 한 달여 지난 1912년 1월 17일 그곳에 도착한 스콧 일행은…
노르웨이 국기와 아문센이 남긴 텐트, 편지를 발견하고 남극점 최초 정복 목표를 상실하게 된 스콧 일행은 귀환 길에 예상치 못한 악조건에 직면하며 비극을 맞았습니다.
연료 저장고에서 난방 및 조리용 연료가 샌 것도 모자라 식량까지 부족했죠. 문자 그대로의 설상가상으로 예상보다 거셌던 눈보라와 추위가 이동을 방해하던 와중에 일부 대원들이 설맹증을 앓아 그렇지 않아도 묶였던 발은 아예 굳어버렸고요.
이런 상황에 대원 중 한 명이던 로런스 에드워드 그레이스 오츠(Lawrence Edward Grace Oates, 1880~1912) 대위는 동상과 체력 고갈로 일행에 짐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채 스스로 목숨을 버렸지만 이런 희생에도 남은 모두는 보급 기지까지 불과 17㎞를 남기고 1912년 3월 29일경 동사했습니다.
시민 발걸음 제한하는 도심의 설맹
남극점 최초 도달 실패라는 패배감보다 스콧 일행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은 악재 중 하나였던 설맹증.
고글 없이 설원을 행군하던 일행 중 설맹증이 유독 심했던 에드워드 윌슨(Edward Adrian Wilson, 1872~1912) 박사는 동료가 끄는 썰매에 매달려 눈을 감은 채 걸어야 했는데 이는 전체의 행군 속도를 치명적으로 늦췄고 결국 모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시야를 잃은 대가는 죽음이었던 거죠.
2025년 12월 4일, 그날 밤 서울은 도로 위 설맹에 발길이 잡혔습니다. 100여 년 전 남극의 비극을 오늘날 도심에 대입하는 건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분명한 하나는 우리 사회가 적절한 대처 없이 시야를 잃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날 제설작업의 적기를 놓친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됐고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죠. 글이 길어져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만 꼽겠습니다. 4일 저녁 7시께부터 봉담과천고속도로 청계IC~의왕IC 구간에서는 운전자들이 무려 9시간 30분 동안 도로 위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설차량조차 진입하지 못한 이 시간 동안 시민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했고요.
경기 남부에서만 아침까지 접수된 폭설 관련 피해 신고는 1900건을 넘어섰고 서울 도심 평균 통행 속도는 사람이 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시속 20.9㎞/h에 머물렀답니다.
눈을 치운다는 건 도로를 깨끗이 하는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죠. 제설은 80%의 자외선을 반사하는 눈을 걷어내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일이자 빙판을 없애 1.5톤의 쇳덩어리가 흉기로 돌변하는 것을 막는 업무입니다.
설맹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교통마비 역시 제설제 살포와 선제적 인력 배치 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스콧의 비극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앞을 봐야 안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정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