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1월 9일, 분단의 상징이 무너졌습니다. 동서 냉전의 상징이던 독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사람들은 망치와 정을 들고 달려들며 억압을 넘어선 인류의 자유를 향한 열망, 그 자체를 보여줬죠.
당시 우리 국민은 독일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20일 나온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2025' 발표 자료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1%에 달했다고 하네요.
이 발표 자료는 한국리서치가 올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면 면접 조사한 결과로 만들었습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평화적 공존'을 선호했다는데 젊은이들은 통일보다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을 더 현실적이고 우선적인 목표로 본다는 거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마자 망치와 정을 들고 달려들며 분단 극복의 기쁨을 표출하던 독일인들의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날이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중 씨가 떠올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망치와 정을 들고 달려들던 사람들 중에는 단순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냉철한 시장 논리를 계산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장벽의 잔해는 순식간에 '자유의 상징'이라는 이름의 상품으로 둔갑한 채 아크릴 케이스에 담겨 전 세계 박물관과 기념품점을 돌며 고가에 팔려 나갔거든요.
조선 후기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의 기만극과 같은 다른 사례들도 알아봤습니다. 베를린 장벽처럼 실제 효용 가치보다 상징성을 내세워 판매에 성공한 대표 사례들입니다.
1980년대, 달의 땅을 팔아치운 데니스 호프는 국제연합(UN) 우주 조약의 맹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국가는 우주를 소유할 수 없지만, 개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허점이었는데 호프는 달과 행성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한 겁니다.
구매자들이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달 토지 소유 증명서'라는 종이 한 장뿐이었고요.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나 조지 루카스 감독, 배우 톰 행크스, 클린트 이스트우드, 니콜 키드먼 등 유명인들까지 지갑을 열 정도로 호프의 장사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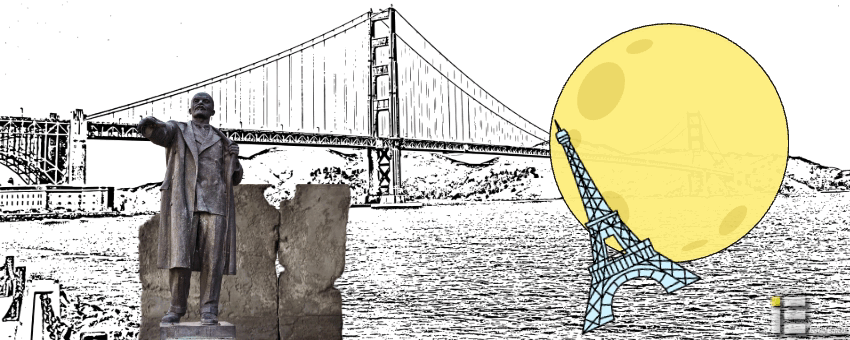
또 다른 사례로 1937년 건설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거론할 수 있죠. 1970년대 말 이후 대규모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체된 녹슨 볼트와 나사를 '역사의 조각'이라며 고가의 기념품으로 판매한 사실은 꽤 널리 알려진 얘기이고요.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는 게 세상의 이치인지라 이야기 장사의 한계도 살펴봤습니다. 19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며 처치곤란 애물단지가 된 슬로바키아 포프라드의 블라디미르 레닌 동상을 미국의 사업가 루이스 카펜터가 1만3000달러에 사들였죠.
미국 시애틀로 동상을 가져온 그는 역시나 수익 창출을 동상을 교외에 전시하려 했으나 공산주의 독재자의 상징을 거부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에 막혀 다시 처치곤란 방치되는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더해 에펠탑 판매 사기 사건까지 소개하며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1925년, 프랑스 파리에는 에펠탑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정부가 매각을 고려한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체코 출신의 사기꾼 빅토르 러스티그는 자신을 프랑스 체신부 차관이라고 속여 고철 재활용 사업자들을 모집한 후 고철 처리권 매각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니 극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허위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현금을 챙긴 러스티그는 곧장 오스트리아 빈으로 도주했으나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에펠탑을 사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조롱당할까봐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제까지 알아본 사례들은 현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현대판 김선달들은 물질적 가치에 포장지를 씌워 비물질적 가치로 팔아넘겼죠.
소비자 가치 책정의 빈틈을 노린 시장 원리를 활용한 이들의 농간을 되새기며, 앞으로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갑을 열 때마다 물질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짚는 지혜를 살렸으면 합니다. 헛된 돈은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너무 빙빙 돌려 죄송합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